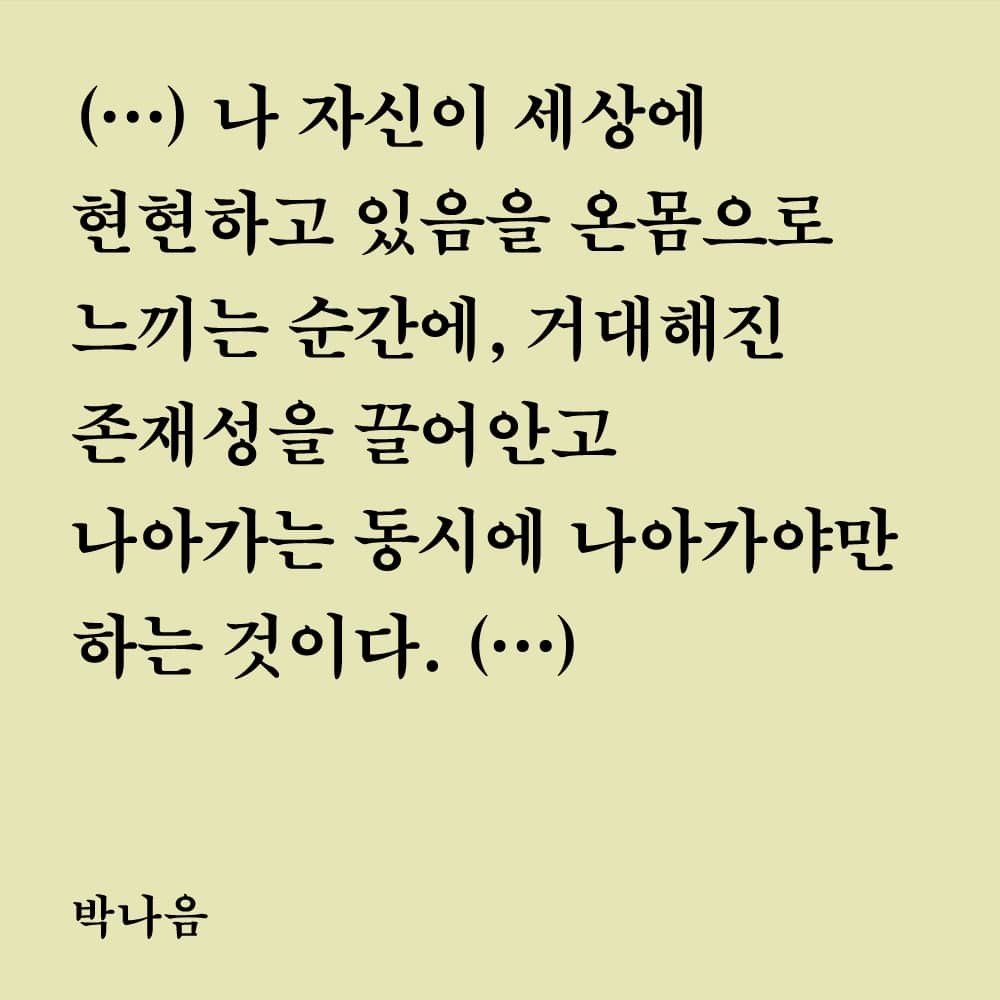《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IMA AMI 노트
박나음
IMA AMI 6기 ‘이한’.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에서 <오래된 약국 2021>을 운영했다. 타국에서 미술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영화관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훔치는 이야기를 믿는다.
공간 속에서 나를 찾다
하이데거는 <Building, Dwelling, Thinking>이라는 텍스트에서 ‘건축하다’라는 단어에 대해 사유하였다. 그는 독일어 단어 bauen(짓다, 건축하다)를 사용하여 Ich bin(I am)에 대한 번역을 시도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하다는 말은 거주하다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Ich bin은 곧 I dwell(나는 거주하다)이었음을 설명한다.
하이데거의 말을 풀어보면, 내가 있고 타자가 있는 양식이자 인간이 땅 위에 있는 방식은 거주함이다. 나는 이것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미술관이든 카페든 집이든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자신의 실존에 대해 자각을 한다. 하나의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자각의 순간에, 자신의 존재성의 크기가 거대해지기 때문이다. 매일 건너는 신호등이 있거나 매일 탑승하는 지하철이 있다고 해보자,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특별히 새롭게 자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낯선 공간 혹은 명소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크게 자각한다. ‘이곳에 왔구나, 나는 이곳에 있구나’ 라는 방식이다. 나 자신이 세상에 현현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에, 거대해진 존재성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동시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서포터즈 기간 동안 나는 일민미술관에 있었다(Ich bin). 이 말은 얼마나 많은 말과 결합할 수 있는 말인가. 사실 Ich bin(I am)은 나는 –이다, 라는 의미이므로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현현하는 공간 속에서 나의 감정과 직업과 이름과 성별과 나이와 출신과 모두 결합한다. 즉, 공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일은, 나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자신의 자의식이 거대해진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현존을 마침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볼 것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로 건너가게 된다. 나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있다는 선행적 사고는, 비로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나와 마주하게 할 것인가라는 후행적 사고를 만든다. 그 후행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일어날 때, 세상은 조금씩이나마 기꺼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공간의 이면을 겪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건물로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가 건축했다. 석회암과 대리석을 이용하여 단정한 미니멀리즘을 실현한 이 건축물은 1929년에 완공되었다. 물에 반짝이는 햇빛이 흰 회벽 안으로 빛이 밀려온다. 불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덜어내어 단조롭기 때문에 세련된 공간이다. 1999년 제프 월(Jeff Wall)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의 제목은 Morning cleaning으로, 한 사람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내부를 청소도구로 청소하고 있는 장면이다. 시네마토그래픽으로 연출된 이 사진은 기존의 공간이 가지고 있던 색감과 다른 색감이 나타난다. 변화된 조도로 붉고 푸름이 섞여 있다. 한 사람은 대형 창문 앞에 몸을 숙여 청소 도구를 들고 있고 창문에 묻어있는 거품들로 보아서 그가 창문을 닦고 있던 중임을 알 수 있다.
11시 오픈인 일민미술관을 10시 50분 정도에 입장하여 4층에서 흰색 가운을 입는다. 가운을 입고 2층 전시실로 내려가 ‘오래된 약국’으로 가면 모든 스위치가 꺼져있다. A, B, C 코너의 불을 켜고 영상을 재생하고 헤드폰의 음질을 확인한다. A코너에서는 향초와 종이를 확인하고 B코너에서는 인형과 이불을 정돈하고 C코너에서는 향의 잔여 분량을 살펴본다. 이처럼 오픈하기 전 ‘오래된 약국’을 살펴보는 시간은, 사람이 없이 조용하고 한산한 이면의 공간이다. 관객으로 미술관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포터즈로 미술관에서 들어서는 일은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을 달라지게 하였다. 동선을 따라서 전시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가 유지되도록 지켜가는 시선이었다. 마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내부가 제프 월 사진에 의해 다르게 연출되는 것처럼. 제프 월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조도와 색감처럼.
‘오래된 약국’을 오픈하면 오전 11시다. ‘오래된 약국’은 파트를 나눠서 A, B코너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C코너를 한 사람이 담당했다. 관객이 오면 코너별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 안내를 도와주고 각각의 코너가 담고 있는 의의와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관객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동료와 역할 분담이 중요했다. 상대적으로 B코너에 관객이 많았기 때문에 B코너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C코너 담당자가 A코너를 도와주어야 했다. 상황에 맞게 서로를 도와주는 파트너십의 의미가 컸다. A코너는 관객이 작성한 과거의 기억을 태워주는 과정에서, C코너는 관객에게 조향을 해주는 과정에서, 관객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관객은 그 순간의 의사소통으로 전시체험의 순간을 얻어가게 되므로, 관객을 마주한 시간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관객을 마주한 시간에서 밀려오는 때로는 유연하고 때로는 긴장되는 찰나들이 흥미로운 진폭을 형성하였다.
일민미술관 밖을 내다보면 날씨가 잘 보였다. 해가 뜨겁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시원한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많았다. 일민미술관 밖으로 보이는 계절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변화했다. 어색했던 동선이 익숙해졌고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오래된 약국’은 오전과 오후 타임에 각각 두 명씩 담당했다.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각자 다양한 형태의 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각각 다양하고 넓은 세상으로 각각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가능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각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촬영한 제프 월이 될지도 모르고, 언젠가 각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건축한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될지도 모른다. 낭만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즐비한 세상에서 꿈꾸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면,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 서포터즈 활동은 허황된 낭만일지라도 꿈꿔본다면 달라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지원하였다. 스스로를 찾고, 움직이는 시간이었다.